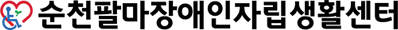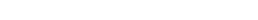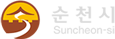"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문구가 적힌 메달. ⓒakgimages.com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문구가 적힌 메달. ⓒakgimages.com“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mens sana in corpore sano).”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가 쓴 시의 한 소절이다. 사실, 이 문구는 육체의 강건함과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당대 로마인들을 풍자한 경구다. 인간에게 육체 단련만큼 정신 수양도 중요하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유럽 계몽주의자들이 이 말의 본뜻을 뒤집었다.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프랑스 귀족 쿠베르탱은 이 경구를 올림픽 슬로건으로 사용했다. 스포츠를 통해 허약한 근대 남자들의 육체를 로마 검투사처럼 강건하게 단련하자는 취지였다.
영국 계몽주의 철학자 존 로크는 <미래를 위한 자녀교육>에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오늘날 행복한 상태를 짧지만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건강한 육체의 소중함부터 가르치자는 것이 그의 교육론이었다.
이처럼 서양 계몽주의자들은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했다.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데카르트식 이원론과 자연세계의 원인과 결과를 발견하려는 근대과학이 절묘하게 조합된 논리다. 이런 해석은 현대 사회에서도 유력하다. 그래서 오늘날 스포츠와 교육 영역에서 신체 건강이 정신적 웰빙의 출발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특히, 서양의 문학과 영화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공식을 충실하게 따른다. 신체가 정신을 결정한다는 세계관에 따라 장애 이미지를 생산한다. 이것은 서양 문학의 원형인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장애인 ‘테르시테스’부터 현대 재현 매체에 등장하는 ‘괴물’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는 전통이다.
이를테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서 건강한 외모의 지킬은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의사지만, 그 외모가 흉측하게 바뀌면서 살인마 하이드가 된다. 하이드의 현대판이 헐크다. 헐크는 분노와 공포를 느낄 때 육체가 기형적으로 변화하면서 성격이 포악해진다.
이 밖에도 <피터 팬: 자라지 않는 아이>의 ‘후크 선장’, <보물섬>의 ‘외다리 실버’, <모비딕>의 ‘아합 선장’, <오페라의 유령>의 ‘에릭’은 모두 신체적 상실이 정신적 타락으로 이어진 캐릭터다. 근대 서양 문학에서 신체적 장애인을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캐릭터로 묘사한 경우는 <파리의 노트르담> 주인공 ‘콰지모도’가 거의 유일하다.
문학보다 재현 효과가 훨씬 더 강렬한 영화도 마찬가지다. 신체-정신 인과론을 가장 충실하게 재현한 영화는 <배트맨> 시리즈다. 얼짱에다 몸짱인 배트맨은 정신도 정의롭고 아름답다. 반면, 그의 상대역 조커들은 하나 같이 신체적으로 기형이고 따라서 정신적으로 사악하다.
또 영화 <300>의 ‘에피알테스’는 장애인으로 태어나 당시 법률에 따라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는다. 하지만 성인이 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조국 스파르타를 배반하는 악인이 된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간사하고 사악한 ‘골룸’은 <일리아스>의 ‘테르시테스’를 그대로 재현한 이미지다. 이 밖에도 신체적 손상이 정신적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모티브를 활용한 영화가 할리우드에 넘쳐난다.
서양과 달리 동양은 육체의 세계보다 정신의 세계를 훨씬 더 강조한다. 예컨대, 대표적인 유학 경전 중 하나인 대학은 수신제가를 이렇게 설명한다. “心正而後身修(심정이후신수)” 즉 마음을 바르게 한 후에 몸을 수양하고, “身修而後家齊(신수이후가제)” 즉 몸을 수양한 후에 집안을 다스린다. 그런 연후라야 치국하고 평천하할 수 있다.
이 점증법 구절의 출발은 심정(心正) 곧 “건강한 정신”이다. 서양의 전통과 달리 동양은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가 깃든다”고 가르친다. 그래서인지 서양인들은 성인과 영웅의 동상(신체)을 남겼지만, 동양인들은 그들의 책(정신)을 남겼다.
이 같은 전통에서 동양 문학은 장애인을 가련한 존재로 묘사할지언정 정신이 사악한 존재로 그리지는 않는다. 우리 문학만 보더라도 <심청전>의 ‘심봉사’, <백치 아다다>의 ‘아다다’, <벙어리 삼룡이>의 ‘삼룡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아버지’, <수난이대>의 ‘아버지와 아들’은 장애 때문에 억압을 받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잃지 않는다. 이런 소설의 기본 틀은 악하고 억압적인 비장애인 대 선하고 박해받는 장애인의 대결 구도다. 서양의 근대 문학과 비교할 때 거의 정반대 구도이다.
그리스-로마인들의 종교에는 내세관이 없었다.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현재가 전부다.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고 자체가 없었기에, 지금-여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만끽해도 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다. 아름답고 건강한 육체를 탐닉하는 것도 그 중 일부였다. 이처럼 현실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조롱했던 것이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 서양 근대인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종교만 제외하고 철학도, 건축물도, 예술도, 정치 시스템도, 스포츠도, 심지어 인간의 신체관까지 모든 것을 그리스-로마인들을 본받으려고 했다. 그 결과가 부정적이고 왜곡된 장애 이미지의 대량생산이었다.
다행스럽게, 20세기 후반부터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서양의 문학과 영화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장애운동과 장애학이 등장하고 발전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자기 이미지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몸을 투쟁 현장으로 인식한 장애인들의 비판 의식 덕분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