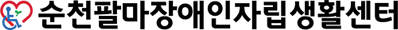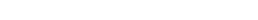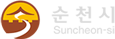종합심리검사를 통해 자폐를 진단받았지만 자폐인 정체성은 아직 내게 낯설었다. 아니, 자폐인 정체성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영아 때부터 언어 발달이 빨랐고 성적이 우수했다. 성인이 되어서도 국립대에 입학하고 학점이며 대외활동이며 동아리도 살뜰히 챙겼다. 사회로 진출한 후에는 칭찬을 들으면서 일했다. 그런 나를 발달장애인으로 칭하는 것이 어울릴까 생각했다.
내가 ‘전형적인’ 자폐인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내가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칼럼을 쓰거나 외부 인사를 접견할 때면 여전히 나를 정신장애인이라고만 소개했다. 병원을 바꾼 이유나 심리검사를 받은 이유를 물어보면 병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심리검사를 받은 지 오래되어서라고 둘러댔다.
사실은 조금 두려웠다. 내가 자폐 진단 사실을 공연히 밝혀서 ‘네가 무슨 자폐냐’라거나 ‘당신은 가짜 장애인이다’라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았다.
자폐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 내가 자폐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사람들이 나를 ‘정신장애인이 아닌 발달장애인’이라고만 생각할 것 같았다. ‘발달장애인이 정신장애인 행세를 한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자폐 진단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개되고 말았다. 나와 친한 당사자 한 분이 다른 직장 동료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미등록 자폐인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이었다.
그 동료분들은 처음에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가 이내 의미를 깨닫고는 그런 사적인 내용을 밝혀도 좋은지 물어봤다. 나는 당황해서 웃어넘겼다. 그 뒤로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자폐 정체성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했다.
내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밝혀지는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 선생님이 내가 자폐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한 것이었다. 내가 자폐 진단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등록장애인이 되고 싶은 것도 사실이었으나, 자폐로 장애인 판정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진단을 받긴 했으나 장애 심사는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나와 같이 일하시는 교수님께서 내가 자폐 진단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물어보셨다. 그 자리에는 나와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님들과 처음 보는 정신장애인 분들도 계셨다. 어쩔 수 없이 종합심리검사 상 자폐 소견을 받았음을 밝혀야만 했다.
이렇게 나의 자폐 정체성이 총 세 번 ‘누설’되고야 말았다. 나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자폐 정체성을 ‘영업 비밀’로 남겨두고 싶었었다. 아마 몇 달 뒤나 일 년 뒤에 좋은 기회가 생기겠거니 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의 정체성이 뜻하지 않게 공개되고 나니 나는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의 진단 사실이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고 그렇다면 ‘정신장애 정체성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자폐 정체성은 창피해하는 활동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정신장애 정체성도, 자폐 정체성도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의 의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본모습을 알기 위해 받았던 진단이지만 결국 그 중심에 나는 없었다.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을 의식하기만 할 뿐이었다.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직업으로 삼은 내가 나의 자기옹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황해하면서도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당당하게 밝힌 것도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고 내 정체성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넘겨버렸던 것이다.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이 칼럼을 쓴다. 처음 세 번은 뜻하지 않은 공개였지만 나 자신이 자폐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공개하는 과정은 나 스스로 매듭짓고 싶다.
진단을 받는 것,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 정체성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을 회복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옹호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더욱 확고한 신념이 생겼다. 그 신념으로 사업계획서를 쓰고 당사자를 위한 일을 계속할 힘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자폐인 정체성이 어색하다.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은 현재진형행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의 자폐적인(autistic) 삶을 스스로 찾아나갈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